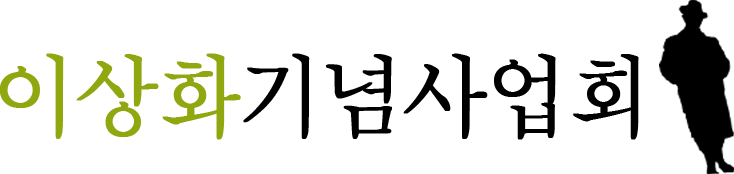몽환병(夢幻病) - 1921년 작
-이상화-
목적(目的)도 없는 동경(憧憬)에서 명정(酩酊)하던 하루이었다.
어느 날 한낮에 나는 나의 「에덴」이라던 솔숲 속에 그날도
고요히 생각에 까무러지면서 누워 있었다.
잠도 아니오 죽음도 아닌 침울(沈鬱)이 쏟아지며 그 뒤를 이어선
신비(神秘)로운 변화(變化)가 나의 심령(心靈)위로 덮쳐 왔다.
나의 생각은 넓은 벌판에서 깊은 구렁으로- 다시 아참 광명(光明)이 춤추는 절정(絶頂)으로- 또다시 끝도 없는 검은 바다에서 낯선 피안(彼岸)으로- 구름과 저녁놀이 흐느끼는 그 피안(彼岸)에서 두려움 없는 주저(躊躇)에 나른하여 눈을 감고 주저앉았다.
오래지 않아 내 마음의 길바닥 위로 어떤 검은 안개 같은 요정(妖精)이 소리도 없이 오만(傲慢)한 보조(步調)로 무엇을 찾는 듯이 돌아다녔다. 그는 모두 검은 의상(衣裳)을 입었는가- 하는 억측(憶觸)이 나기도 하였다. 그때 나의 몸은 갑자기 열병(熱病)든 이의 숨결을 지었다. 온몸에 있던 맥박(脈搏)이 한꺼번에 몰려 가슴을 부술 듯이 뛰놀았다.
그리하자 보고싶어 번개불같이 일어나는 생각으로 두 눈을 비비면서 그를 보려하였으나 아- 그는 누군지- 무엇인지- 형적(形跡)조차 언제 있었더냐 하는 듯이 사라져 버렸다. 애달프게도 사라져 버렸다.
다만 나의 기억(記憶)에는 얼굴에까지 흑색(黑色) 면사(面紗)를 쓴 것과 그 면사(面紗) 너머에서 햇살 쪼인 석탄(石炭)과 같은 눈알 두 개의 깜작이던 것뿐이었다. 아무리 보고자 하여도 구름 덮인 겨울과 같은 유장(帷帳)이 안계(眼界)로 전개(展開)될 뿐이었다 발자국 소리나 옷자락 소리조차도 남기지 않았다.
갈피도- 까닭도 못 잡을 그리움이 내 몸 안과 밖 어느 모퉁이에서나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같이 흘러내렸다- 흘러내렸다. 숨가쁜 그리움이었다- 못 참을 것이었다.
아! 요정(妖精)은 전설(傳說)과 같이 갑자기 현현(現顯)하였다. 그는 하얀 의상(衣裳)을 입었다. 그는 우상(偶像)과 같이 방그레 웃을 뿐이었다.- 보얀 얼굴에- 새까만 눈으로 연붉은 입술로- 소리도 없이 웃을 뿐이었다. 나는 청맨관의 시양(視樣)으로 바라보았다.- 들여다 보았다.
오! 그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이었다.- 잊혀지지 않는 그의 얼굴이었다.- 내가 항상 만들어 보던 것이었다.
목이 메이고 청이 잠겨서 가슴속에 끓는 마음이 말이 되어 나오지 못하고 불김 같은 숨결이 켜이질 뿐이었다. 손도 들리지 않고 발도 떨어지지 않고 가슴 위에 쌓인 바윗돌을 떼밀려고 애쓸 뿐이었다.
그는 검은 머리를 흩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왔다. 나는 놀라운 생각으로 자세히 보았다. 그의 발이 나를 향하고 그의 눈이 나를 부르고 한 자국- 한 자국- 내게로 와 섰다. 무엇을 말할 듯한 입술로 내게로- 내게로 오던 것이다.- 나는 눈이야 찢어져라고 크게만 떠보았다. 눈초리도 이빨도 똑똑히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고 나를 보았다.- 들여다보았다. 아 그 눈이 다른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 눈을 뚫을 듯한 무서운 눈이었다. 아 그 눈에서- 무서운 그 눈에서 빗발 같은 눈물이 흘렀다. 까닭 모를 눈물이었다. 답답한 설움이었다.
여름 새벽 잔디풀 잎사귀에 맺혀서 떨어지는 이슬과 같이 그의 깜고도 가는 속눈썹마다에 수은(水銀)같은 눈물이 방울방울이 달려 있었다. 아깝고 애처로운 그 눈물은 그의 두 볼- 그의 손등에서 반짝이며 다시 고운 때묻은 모시 치마를 적시었다. 아!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싶은 귀여운 눈물이었다. 뼈 속에 감추어 두고 싶은 보배로운 눈물이었다.
그는 어깨를 한두 번 비슥하다가 나를 등지고 돌아섰다. 흩은 머리 숱이 온통 덮은 듯하였다. 나는 능수버들같은 그 머리카락을 안으려 하였다.- 하다못해 어루만져라도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저리로 갔다. 어쩔 줄 모르는 설움만을 나의 가슴에 남겨다 두고 한 번이나마 돌아볼 바도 없이 찬찬히 가고만 있었다. 잡을래야 잡을 수 없이 가다간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눈알이 빠진 듯한 어둠뿐이었다. 행여나 하는 맘으로 두 발을 괴고 기다렸었다. 하나 그것은 헛일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는 가고 오지 않았다.
나의 생각엔 곤비(困憊)한 밤의 단꿈 뒤와 같은 추고(追考)- 가상(假想)의 영감(靈感)이 떠돌 뿐이었다. 보다 더 야릇한 것은 그 요정(妖精)이 나오던 그때부터는- 사라진 뒤 오래도록 마음이 미온수(微溫水)에 잠긴 얼음 조각처럼 부류(浮流)가 되며 해이(解弛)되나 그래도 무정방(無定方)으로 욕념(慾念)에도 없는 무엇을 찾는 듯하였다.
그때 눈과 마음의 렌즈에 영화(映畵)된 것은 다만 장님의 머리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혼무(混霧)뿐이요 영혼(靈魂)과 입술에는 훈향(薰香)에 미친 나비의 넋 빠진 침묵(沈黙)이 흐를 따름이었다. 그밖엔 오직 망각(忘却)이 이제야 뗀 입 속에서 자체(自體)의 존재(存在)를 인식(認識)하게 된 기억(記憶)으로 거닐 뿐이었다. 나는 저물어 가는 하늘에 조으는 별을 보고 눈물 젖은 소리로 「날은 저물고 밤이 오도다 흐릿한 꿈만 안고 나는 살도다」고 하였다.
아! 한낮에 눈을 뜨고도 읽던 것은 나의 병(病)인가 청춘(靑春)의 병(病)인가? 하늘이 부끄러운 듯이 새빨개지고 바람이 이상스러운지 속살일 뿐이다.
해설 :
시는 몽환이다. 꿈이다. 이미지다. 상사병이다. 이즘 고창 선운사에 가면 상사화가 빨갛게 피어 몽환의 아픈 가슴을 앓고 있을 것이다.
이상화 시인의「몽환병」을 읽었다. 이 시는 1925년 『조선문단』12호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해는 상화가 <카프>에 가입한 해로, 가장 문학에의 열정을 보여준 해이기도 하다. 사실 그의 작품 80여 편 중 1925년과 1926년에 발표한 작품이 50여 편이 넘는다. 이 시는 그의 낭만적 초기시의 요소와 중, 후기의 민족적 휴머니즘시세계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시「몽환병」은 장시에 속한다. 몽환의 내면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니, 부득이 말이 산문적으로 길어져서 쓸데없는 설명이 들어가고, 시의 긴축이 떨어지는 작품이 되어버렸다.
몽환, 즉 환상은 시인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 공상과는 다르다. 즉 시인의 강박증, 내면현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래서 몽환병이다. 상화의 산문을 보면, 그해 상화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은 감상문을 썼다.「죄와 벌」의 소냐,「백치」의 나스타샤,「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대해 읽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이라는 계역을 벗어나려 아니한, 사람다운 사람, 곧 진실의 화신으로 미와 선을 수태하게 된, 사람의 생명 파악, 심연을 들여다 본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
그의「몽환병」을 읽었다. 시인은 한때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심한 열병을 앓았다. 넓은 벌판에서 깊은 구렁으로, 끝도 없는 검은 바다에서 낯선 산 피안으로 헤매며 눈을 감고 있었다. 한 검은 옷 입은 요정이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놓쳐버리고, 다시 현현한 하얀 의상의 요정을 만난다. '내가 항상 만들어 보던 그 얼굴'을 만나고 목이 메지만 가위눌림에 꼼짝을 못한다. 그는 다가오고 나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린다. 안타깝고 애처러운 눈물, 받아먹고 싶은 눈물, 그의 머리카락을 안으려 했는데, 가버리는 그. 그리고 시인은 '흐릿한 꿈만 안고 나는 살도다'고 탄식하고 있다. 어쩜 이 시는 이듬해인 1926년에 타계한 그의 연인 유보화에 대한 그리움, 이별을 결심한 강박이 빚어낸 환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의 초기시「나의 침실로」에 보이던 격정적, 낭만적 호흡은 가라앉고, 다소 차분해진 서술과 관찰로 몽환의 영상을 쫓아 마음의 상태를 묘사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에서 시인과 독자들이 만나는 정서는 연민이다. 이제 사랑은 격정이 아니고 연민이다. 떠나가는 한 인간과 남은 자에 대한 연민이다. 그리하여 상화의 시세계는 초기의 낭만적, 감상적 세계에서 차차 현실적, 민중적, 민족적 휴머니즘으로 승화되어 큰 시인으로 자리잡음을 하는 것이다.
해설 : 박정남(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