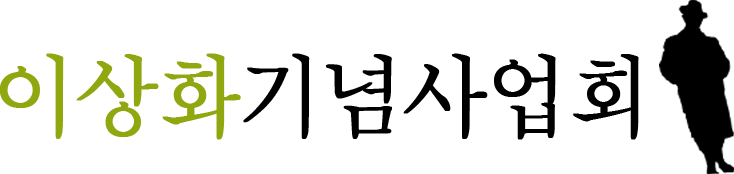지반정경(池畔靜景)
-이상화-
- 파계사(把溪寺) 용소(龍沼)에서
능수버들의 거듭 포개인 잎 사이에서
해는 주등색(朱橙色)의 따사로운 웃음을 던지고
깜푸르게 몸 꼴 꾸민, 저편에선
남 모르게 하는 바람의 군소리- 가만히 오다.
나는 아무 빛깔에도 없는 욕망(慾望)과 기원(祈願)으로
어디인지도 모르는 생각의 바다 속에다
원무(圓舞) 추는 혼령(魂靈)을 뜻대로 보내며
여름 우수(憂愁)에 잠긴 풀 사잇길을 오만(傲慢)스럽게 밟고 간다.
우거진 나무 밑에 넋빠진 네 몸은
속마음 깊게- 고요롭게- 미끄러우며
생각에 겨운 눈물과 같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빈 꿈을 얽매더라.
물위로 죽은 듯 엎디어 있는
끝도 없이 열푸른 하늘의 영원성(永遠性)품은 빛이
그리는 애인(愛人)을 뜻밖에 만난 미친 마음으로
내 가슴에 나도 몰래 숨었던 나라와 어우러지다.
나의 넋은 바람결의 구름보다도 연약(軟弱)하여라
잠자리와 제비 뒤를 따라, 가볍게 돌며
별나라로 오르다- 갑자기 흙 속으로 기어들고
다시는 해묵은 낙엽(落葉)과 고목(古木)의 거미줄과도 헤매이노라.
저문 저녁에, 쫓겨난 쇠북 소리 하늘 너머로 사라지고 이 날의 마지막
놀이로 어린 고기들 물놀이 칠 때
내 머리 속에서 단잠 깬 기억(記憶)은 새로이 이곳 온 까닭을 생각하노라.
이곳이 세상 같고, 내 한 몸이 모든 사람 같기도 하다!
아 너그럽게도 숨막히는 그윽함일러라 고요로운 설움일러라.